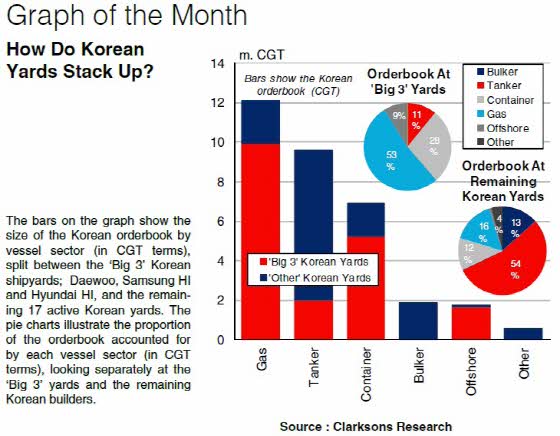|
|
‘메가 컨선’ 발주로 글로벌 수주잔량도 증가세
|
 |
| ▲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2만1천100TEU급 컨테이너선 조감도.ⓒ삼성중공업 |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 시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8천TEU급 이상 선박만 37척이 발주되는 등 활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크선 시장은 같은 기간 발주량이 58척에 그치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간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총 113척(1천520만DW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척수 기준 글로벌 선박 발주량(553척, 4천630만DWT)의 20.4%, DWT 기준으로는 32.8%에 달한다.
선박 크기별로는 8천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76척 발주됐으며
3천~8천TEU급은 18척, 3천TEU급 미만 선박은 19척이 발주됐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지난해에도 68척이 발주되며 활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3천TEU급 미만 선박은 지난해 연간 73척이 발주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중 1만8천TEU급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선’이 37척(820만DWT) 발주되며
DWT 기준 전체 컨테이너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컨테이너선은 올해 1월 일본 선사인 쇼에이키센카이샤(Shoei Kisen Kaisha)가
자국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에 11척의 1만8천TEU급 선박을 발주한데
이어 2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2만TEU급 선박을 수주하는 등
연초부터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8천~1만8천TEU급 선박은 39척이 발주됐는데 지난달 중국 CSCL(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가
자국 조선소에 1만3천500TEU급 8척을,
일본 NYK(Nippon Yusen Kaisha)가 JMU(Japan Marine United)에 1만4천TEU급 2척을 발주하는 등
1만3천~1만4천TEU급 선박 발주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올해 말 파나마운하가 확장개통될 경우 최대 1만4천TEU급 선박까지 통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파나막스급인 4천~5천TEU급 선박보다 1만4천TEU급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벌크선 발주는 DWT 기준 전체 발주량의 14.3%인 660만DWT(58척)에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년 동기 벌크선 발주가 635척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1년 간 척수 기준으로는 90.9%나 줄어든 것이다.
수주잔량에서도 벌크선은 지난달 말 기준 1억3천560만DWT(1천667척)으로
지난해 말(1억7천610만DWT, 2천121척) 대비 척수 기준으로 23% 줄었다.
벌크선 대표선종인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경우 수주잔량이 5천340만DWT(270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말(7천390만DWT, 375척) 대비 27.7% 감소한 것이며 수주잔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10월(1억6천440만DWT, 886척)에 비해서는 67.5% 급감한 것이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의 수주잔량은 4천180만DWT(427척)로 지난해 말(3천980만DWT, 458척) 대비
선박 척수는 감소했으나 DWT 기준으로는 200만DW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